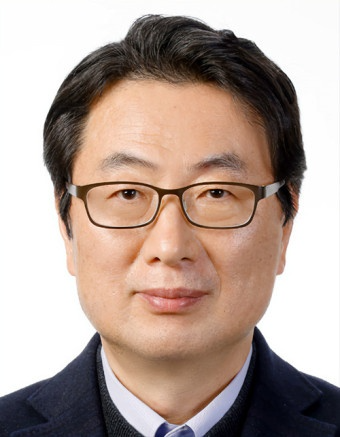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글 싣는 순서
①우리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은 글로벌 A등급 수준인가? ②계약형이냐 기금형이냐, 퇴직연금지배구조의 선택
③제3회: 퇴직연금 기금형, 현실적 대안을 찾아서
국제연금평가기관(MCGPI)은 2009년부터 매년 공적·사적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나라별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해 공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큰 변화 없이 평가 대상 국가 중 하위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연금급여의 적정성(40점),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35점),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성(25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현재 국회와 정당 차원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 중 하나이며, 퇴직연금제도 또한 일시금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 측면에서 여러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로 법정퇴직금제도가 1961년에 도입된 이래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지난 60여 년간 퇴직금은 '1년 근속에 30일분 평균임금'이라는 퇴직급여공식이 적용되어 왔다. 이와 같은 오랜 관행은 개인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자산의 축적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통계로도 확인된다. OECD 국가들의 사적연금자산 규모는 명목 GDP 대비 평균 98%에 달하지만, 우리는 32%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평균과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의 개선 또는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제외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개선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시급한 개선 과제들
현행 퇴직연금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도출된다.
먼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와 IRP(개인형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 투자 비중이 72%에 달하는 관행적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시행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보수적인 안전 투자 성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World Bank(2012) 보고서에서도 확인되듯, 수익률 제고는 장기적인 투자 지속성과 꾸준한 적립에 달려 있다. 특히 이직이 빈번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퇴직 시마다 기존 투자상품을 현금화하여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하는 불합리한 절차에 직면해 왔었다. 이에 따라 실물 이전 제도가 도입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제도의 실효성은 DC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이 가능할 때 비로소 발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제도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장기 투자 환경 조성이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다음으로,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는 기업의 재무 상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DB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설치와 적립금운용계획서(IPS)의 수립 및 실행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위원회 운영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일명 디폴트 옵션 제도)의 전면적 개선이다. 현행의 백화점식 상품 나열 구조는 마케팅 중심의 경쟁을 유도할 뿐,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난 20년간의 정책 운영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필요 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경희대 성주호 교수 / wow@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